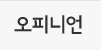лґА~л¶Й’.
мІАлВЬ 1мЭЉ мИЬнЩШкіАкіСл≤ДмК§к∞А 2008лЕД лУ§мЦі м≤Ђ мЪінЦЙнХШлКФ лВ†. л∞ФлЮМмЭА м∞®к∞АмЩАлПД нЦЗмВімЭА нХЬм§М мШ®кЄ∞л•Љ л®ЄкЄИк≥† мЮИмЧИлЛ§.
к∞АмЮ• мЛ†мЭі лВЬ мВђлЮМмЭА мХИлВілПДмЪ∞лѓЄ, кєАм†ХнЭђ(36·мД±нЩШмЭН)мФ®лЛ§. к≤®мЪ∞лВі мВђлђімЛ§лІМ мІАнВ§к≥† мХЙмХШмЬЉлЛИ мШ§м£љ лЛµлЛµнЦИмЭДкєМ. лЛ§мЛЬ кіАкіСк∞Эк≥Љ лІИм£ЉнХЬ м†ХнЭђмФ®мЭШ мЮЕмЭА м≤ЂлВ†мЭЄлН∞лПД м∞ЄмГИм≤ШлЯЉ мЮђмЮШмЮђмЮШ. к≤љл†• 5лЕДмЭі мЦілФФ к∞ИкєМ.
2003лЕД 8мЫФ, мИЬнЩШкіАкіСл≤ДмК§к∞А мЪінЦЙнХЬ мІА 2лЛђмІЄмѓ§. м†ХнЭђмФ®лКФ ‘мХИлВілПДмЪ∞лѓЄ’л•Љ нХШк≤†лЛ§к≥† мЛЬм≤≠лђЄмЭД л∞Ак≥† лЛєм∞®к≤М лУ§мЦімД∞лЛ§. “лЛємЛЬ м≤ЬмХИмЭШ лђЄнЩФ·мЬ†м†БмЧР лМАнХімДЬлКФ мХДлђік≤ГлПД л™∞лЮРмЦімЪФ. кЈЄм™љмЭД м†Дк≥µнХЬ м†БлПД мЧЖкµђмЪФ. лСШмІЄмХДмЭілПД 4мВіл∞ЦмЧР мХИ лПЉ мЮ†кєР лґАмЧЕмЭілВШ нХШмЮРк≥† лђЄмЭД лСРлУЬл†Єм£†.”
мЭінЫД кЈЄлІМ лСРк≤†лЛ§лКФ мГЭк∞БлПД мЧђлЯђл≤И. нХШмІАлІМ 5лЕДмІЄ кЈЄл•Љ мЙђмЮД мЧЖмЭі лː놧мШ§к≤М нХЬ к±і лђімЧЗмЭімЧИмЭДкєМ.
“мХДлІИ мИЬнЩШкіАкіСл≤ДмК§ мЪінЦЙмЧР лМАнХЬ м£Љл≥АмЭШ лґАм†Хм†Б к≤ђнХі лХМлђЄмЭімЧИмЭД к±∞мШИмЪФ. ‘к≥µм£ЉмЛЬлПД нХШлКФлН∞ мЪ∞л¶ђлЭЉк≥† л™їнХ†кєМ.’ мЭіл•Љ мХЕлђЉмЧИм£†.” мЮРм°імЛђмЭД к±і мЛЄмЫАмЭА кЈЄл•Љ мЧім†Хм†БмЭЄ нИђмВђл°Ь лІМлУ§мЧИлЛ§.
м≤ШмЭМ, л™ємЛЬ лВѓмЭД к∞Ал¶∞ нД∞лЭЉ кіАкіСк∞ЭлУ§мЭД л∞ФлЭЉлІМ ліРлПД л≤Мл≤М лЦ®мЧИлЛ§. л∞•лПД лДШмЦік∞АмІА мХКк≥†, лђЉлПД мВЉнВ§мІА л™їнЦИлЛ§. кЈЄл†Зк≤М 1лЕДмЭі нЭШл†АмІАлІМ ‘кЄімЮ•к∞Р’мЭА мЙљк≤М мВђкЈЄлЯђлУ§мІА мХКмХШлЛ§.
“м†БмЭСмЭі мХИ лРРм£†. лІ§мЭЉ к∞ЩмЭА мВђлЮМмЭД лІМлВШл©і нОЄнХім°Мк≤†м£†. нХЬлН∞ лІ§л≤И л∞ФлАМлКФ кіАкіСк∞ЭлУ§мЭШ лВѓмД† лИИкЄЄмЭі мШ®нЖµ лВШмЧРк≤М мП†л¶ђлКФ к±Є лКРкїімЪФ.”
кЈЄлЮШлПД мИЬнЩШкіАкіСл≤ДмК§ мЪімШБмЭі нЩЬмД±нЩФлРЬ к≥µм£ЉмЛЬмЩА мИШмЫРмЛЬл•Љ м∞ЊмХДк∞А л∞∞мЪ∞к≥†, мІАмЧ≠мЭШ кіАкіСлђЄнЩФл•Љ мЭµнЮМ к≤ГмЭі лПДмЫАмЭі лРРмЭДкєМ. мЦЄм†ЬлґАнДік∞А м†Ьл≤Х мЧђмЬ†лПД мГЭк≤ЉлЛ§.
лІ§ м£ЉлІРмЭД л∞ШлВ©нХімХЉ нХШлКФ мГЭнЩЬ. л™З нСЉ мХИ лРШлКФ кЄЙл£МмЧР лИИлђЉмЭі нХС лПМ лХМлПД мЮИмЧИлЛ§. к∞АкєМмЪі мІАмЭЄлУ§ к≤љм°∞мВђмЧРлПД лє†мІИ лХМк∞А лІОмХШк≥†, мЛђмІАмЦі мєЬм†ХмХДл≤ДмІА к≥†нЭђмЧ∞мЧР м∞ЄмДЭнХШмІА л™їнХЬ м†БлПД мЮИлЛ§. “к∞АмЮ• лѓЄмХИнХЬ к±і м£ЉлІРмЭД к∞Ам°±к≥Љ л≥ілВімІА л™їнХЬлЛ§лКФ к±∞м£†. м†Ь мЮРмЛ†мЭШ мЭЉмЧР ‘мґ©мД±’нХШмІА мХКмХШлГРлКФ мЮРкЄНмЛђлІИм†А мЧЖлЛ§л©і л™ї л≤ДнЕЉмЭД к±∞мШИмЪФ. мЦілКР лХМмЭЄк∞А кіАкіСмЭД лІИмєЬ 50лМА мХДм£Љл®ЄлЛИ нХЬ лґДмЭі кЈЄлЯђлНФкµ∞мЪФ. лДИлђі нЦЙл≥µнЦИлЛ§к≥†…, кЈЄлЮШмДЬ лВШлПД нЦЙл≥µнХ©лЛИлЛ§.”
кєАнХЩмИШ кЄ∞мЮР (pusol0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