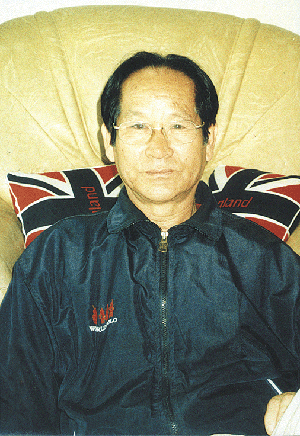
8일(화),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쌍용동)의 한 교실. 늦봄의 나른한 오후시간임에도 아랑곳 않고 노인 몇몇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컴퓨터다. 대부분 70을 넘은 나이임에도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눈빛 가득 서려 있다.
이들 외에 가르치는 노인도 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는 겁니다. 봐요.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매주 화요일을 컴퓨터 자원봉사자로 소일하고 있는 이는 김춘섭(69·신부동) 할아버지. 사람들은 그런 그를 컴퓨터도 잘 하는 ‘떠돌이 작명선생, 김춘섭’이라 부른다.
컴퓨터는 97년 어깨 너머로 잠깐 배웠지만 40여년간 작명가의 삶을 살아온 김 할아버지에게 ‘작명가’란 명칭은 지겹도록 따라다닌다.
“21세때부터 배웠으니 6·25 전쟁이 갓 지난 때였나 봐요.”
김 할아버지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 저자의 성명학을 달달 외고, 사주 추명학 등을 배움으로써 스승없는 작명가 생활에 들어섰다. 5년여의 군생활 후 28세인 50년대 말, 결혼한 색시를 집에 두고 전국을 누비길 20여년.
여관방에서 숙식하며 한 달여 씩 지역을 옮기길 수백 번. “가끔은 안사람과, 자식들(3남매) 커가는 모습을 보러 집에 들릴 정도였죠. 제가 전국을 떠돌아 다녔으니 집안고생은 그만큼 컸었죠.” 안되겠다 싶어 성환에 정착한 것은 70년대 말. 이후 20여년 동안 성환지역의 웬만한 사람들은 그의 작명을 받았다.
지금도 안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에리다.
할머니는 4년전인 97년,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어느 때부터 천주교에 다니더니, 좋은 일 한다고 매일 음성 꽃동네를 다녔죠. 돕는 삶이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날도 그곳 애들 준다고 찰밥을 준비하던 중 쓰러진 거예요.”
주변에선 선하고 편하게 돌아가셨다고 ‘복받은 사람’으로 위안했다. 김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자식들 내보낸 빈집을 가꾸며 통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작명과 컴퓨터 자원봉사자로서 바쁜 삶을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