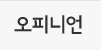мІАлВШмє®мЭА лѓЄмєШмІА л™їнХ®к≥Љ к∞ЩмЭМмЭД вАШк≥ЉмЬ†лґИкЄЙвАЩмЭілЭЉ нХЬлЛ§. кЈЄлЮШмДЬ мШЫ мВђлЮМлУ§мЭА лДШмєШмІАлПД лґАм°±нХШмІАлПД мХКмЭА м§СмЪ©мЭШ лНХмЭД м¶Рк≤ЉлЛ§.
м≤ЬмХИмЛЬлВі к∞ДнМРмЭД л≥ілЭЉ. мШ•мЩЄкіСк≥†лђЉ кіА놮л≤ХмЧР л≥іл©і нХЬ мЧЕмЖМмЧР к±Є мИШ мЮИлКФ к∞ДнМРмЭА мµЬлМА 3к∞Ь. кЈЄлЯђлВШ нШДмЛ§мЭА мµЬмЖМ 3к∞ЬмЧР лІЮмґ∞ мЮИлЛ§. мЛ†л∞©лПЩ л™® мХДнММнКЄ мГБк∞АмЭШ к≤љмЪ∞ 4мЄµ к±ілђЉмЧР 1л∞±к∞Ь лДШлКФ к∞ДнМРмЭі лНХмІАлНХмІА лґЩмЦімЮИлЛ§. к≤МлЛ§к∞А нБђкЄ∞лПД м†Ьк∞Бк∞Б, л™®мЦСк≥Љ мГЙкєФлПД м≤Ьм∞®лІМл≥ДмЭілЛ§.
нШХнШХмГЙмГЙ лВЬл¶љлРЬ к∞ДнМРмЭА мШ§нЮИ놧 к∞ДнМРмЭШ к≥†мЬ†мЧ≠нХ†мЭД мЮГмЭА м±Д мЩЄл©ілЛєнХШк≥† мЮИлЛ§. мЧЕмЖМлУ§к∞Д к≤љмЯБм†БмЬЉл°Ь лЛђмХДлЖУмХШмЭД лњР, к≥ЉмЧ∞ мЖРлЛШлУ§мЭШ лИИмЧР мЮШ лЭМкєМл•Љ л∞∞놧нХЬ к∞ДнМРмЭі мХДлЛИлЛ§.
мЦілЦ§ к±ілђЉмЭі м†Дм≤ім†Б лІµмЛЬ лФ∞лЭЉ к∞ДнМР нХШлВШнХШлВШк∞А лФФмЮРмЭЄлРШк≥† л∞∞мєШлРЬ л∞Шл©і лЛ§л•Є к±ілђЉмЭА 10мЧђк∞ЬмФ© мЧЕмЖМ лІИмЭМлМАл°Ь лЛђмХШлЛ§к≥† нЦИмЭД лХМ к≥†к∞ЭмЭШ лИИк≥Љ кЄ∞мЦµмЭД м¶Рк≤Бк≤М нХім£ЉлКФ к±ілђЉмЭА к≥ЉмЧ∞ мЦілФЬкєМ.
м≤ЬмХИмЭШ мЛЬмДЄк∞А кЄЙк≤©нЮИ нЩХмЮ•лРШк≥† мЮИлЛ§. нХШл£®к∞А лЛ§л•ік≤М нМљм∞љнХШлКФ лПДмЛЬ. кЈЄлЯђлВШ лПДмЛЬлђЄл™ЕлПД мД±мЮ•нХШк≥† мЮИлКФк∞А.
лПДмЛЬ лєЫкєФмЭД лґИмЊМнХШк≤М лІМлУ§к≥† мЭЄк∞Дм†ХмЛ†мЭД мШ§нЮИ놧 нЩ©нПРнХШк≤М лІМлУЬлКФ вАШлђілґДл≥ДнХЬ к∞ДнМРвАЩмЭА мЮРм†ЬлПЉмХЉ нХЬлЛ§. л≤ХмЬЉл°Ь к∞ДнМРмИШл•Љ л™ЕнЩХнЮИ м†ЬмЮђнХШк≥†, кіСк≥†мЯБмЭілКФ мЭім†Ь мЭЉм†Х мЮРк≤©мЭД к∞Цмґ∞ кіСк≥†мЮ•мЭік∞А лПЉмХЉ нХЬлЛ§. к±ілђЉмЭШ нБ∞ нЛА мЖНмЧРмДЬ к∞Бк∞БмЭШ мЧЕмЖМк∞ДнМРмЭД лФФмЮРмЭЄнХШк≥† л∞∞мєШнХШлКФ, кЈЄлЮШмДЬ к∞ДнМРлПД лѓЄнХЩмЭі лР† мИШ мЮИлКФ лŪ놕мЭі мЪ∞л¶ђ л™®лСРмЧРк≤М нХДмЪФнХШлЛ§. нХЬл≤Имѓ§ к∞ДнМРмґХм†Ьл•Љ лІИ놮нХі л≥іл©і мЦілЦ®кєМ.
кіСл≥µм†ИмЧР нГЬкЈєкЄ∞к∞А мЧЖлЛ§
мЪ∞л¶ђ мЦіл†ЄмЭД м†БмЧФ вАШкіСл≥µм†ИвАЩ нХШл©і вАШнГЬкЈєкЄ∞ лЛ§лКФ лВ†вАЩл°Ь мХМк≥† мЮИмЧИлЛ§. кіСл≥µм†ИмЭі л≠ФмІАлКФ л™∞лЮРлЛ§. кЈЄм†А нХЩкµР мХИк∞Ак≥† мХДмє®лґАнД∞ нХШл£®мҐЕмЭЉ нЕФл†ИлєДм†Д лВШмШ§лКФ лВ†л°Ь мГЭк∞БнЦИмЭД лњРмЭілЛ§.
нХЬл≤ИмЭА мХДмє® мЭЉм∞Н мЭЉмЦілВђлЛ§к∞А лє®л¶ђ нГЬкЈєкЄ∞л•Љ кљВмХДмХЉ нХЬлЛ§лКФ мГЭк∞БмЭД к∞Ам°МмЧИлЛ§. мХДл≤ДмІАлКФ м†ХмЫРмЧР нФЉмЦімЮИлКФ кљГлУ§мЧРк≤М лђЉмЭД м£Љк≥† к≥ДмЕ®лЛ§. вАШлє®л¶ђ мХИкљВмЬЉл©і нБ∞мЭЉлВ† нЕРлН∞вАЩ. мЦілЦ§ нБ∞мЭЉмЭЄмІАлКФ л™∞лЮРмІАлІМ мЦіл¶∞ лІИмЭМмЧР лІЙмЧ∞нХЬ м°∞л∞ФмЛђмЭі лВђлЛ§. лСР л≤И мДЄ л≤И мХДл≤ДмІАлІМ м°ЄлЮРлЛ§. мЮ†мЛЬ нЫД нЧИнЧИ мЫГмЬЉмЛЬл©∞ кљВмХДм£ЉмЛ† нЫДмЧРмХЉ мХИлПДк∞Рк≥Љ нХ®кїШ мГБмЊМнХЬ лІИмЭМмЭі лУ§мЧИмЧИлЛ§.
кЈЄл°ЬлґАнД∞ 30мЧђлЕДмЭі нЭШл†АлЛ§. лВШмЭілПД л®єк≥† кіСл≥µм†ИмЭі мЦілЦ§ лВ†мЭЄмІАлПД мХМк≤М лРРлЛ§. кЈЄлХМмЩА лЛђлЭЉмІД к≤ГмЭА лІОмІАлІМ вАШнГЬкЈєкЄ∞вАЩк∞А мВђлЭЉмІАк≥† мЮИлЛ§лКФ к≤ГмЭА нБ∞ мґ©к≤©мЭілЛ§.
кµ≠к≤љмЭЉлХМлІИлЛ§ мІСмІСлІИлЛ§ к±Єл†ЄлНШ нГЬкЈєкЄ∞к∞А нХШлВШ лСШ л≥імЭімІА мХКлКФлЛ§. мµЬкЈЉ 10лЕДмЭА кµ≠к≤љмЭЉ, нГЬкЈєкЄ∞ кµђк≤љнХШкЄ∞к∞А нЮШлУ§ м†ХлПДлЛ§. кЄ∞кїП кіАк≥µмДЬлВШ мЭЉлґА к±∞л¶ђмЧР мГБмІХм†БмЬЉл°Ь кљВмХДлЖУмЭА к≤ГмЭі м†ДлґАлЛ§.
мІАлВЬнХі л™® мХДнММнКЄ лЛ®мІАл•Љ лПМмХДл≥ік≥† нГЬкЈєкЄ∞л•Љ лЛђмХДлЖУмЭА мІСмЭД нММмХЕнХі л≥ілЛИ вАШмЧімЧР нХЬлСРмІСвАЩмЭімЧИлЛ§. мШђнХілКФ мЦілЦ§к∞А. нГЬкЈєкЄ∞ лђіл£Мл°Ь лВШлИ†м£ЉкЄ∞ мЪілПЩкєМмІА л≤МмШАмІАлІМ мЮСлЕД мИШм§АмЧРлПД л™їлѓЄмєШлКФ нШХнОЄмЭілЛ§.
мЭім†Ь мЪ∞л¶ђмЧРк≤М нГЬкЈєкЄ∞лКФ мЦілЦ§ мЭШлѓЄл°Ь лВ®мХДмЮИлКФк∞А. нЦЙмЧђ мШђнХі 8мЫФ15мЭЉмЭД лІРл≥µмЬЉл°ЬлІМ мХМк≥† мЮИмІД мХКмЭАмІА. нХЬл≤Имѓ§ нГЬкЈєкЄ∞мЧР лМАнХі мІДмІАнХЬ к≥†м∞∞мЭШ мЛЬк∞ДмЭД к∞Ам†Єл≥імЮР. кЈЄл¶ђк≥† нГЬкЈєкЄ∞л•Љ мВђлЮСнХШмЮР.